2012년 12월 노들바람 제95호 겨울호
2012년 12월 노들바람 제95호 겨울호
[노들바람을 여는창]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를 치렀습니다. ‘화’를 못
누르고 술을 한 사흘 정도 퍼 마셨습니다. 눈 뜨면 아침, 눈 뜨면 대낮, 세상은 그
대로 굴러가고 내 몸만 바뀌더군요. 아이고 고단해라. 고만하자. 건강한 음식 소
박하게 먹으며 운동하고 차분하고 담담하게 앞으로 살아갈 겁니다, 라며 일상을
추스르는 가운데 사람이 뚝뚝 이 세상에서 떨어져 나가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새
처럼 철탑에, 굴뚝에 둥지를 튼 사람들이 내려오지 못하는 것도 비통한데 저 스스
로 목숨 끊는 노동자들 소식에 사는 게 마냥 무서워지더군요. 희망버스? 노동자대
회? 어디선가 만났을 멀지 않은 그들의 선택이었기에 더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지우와 지훈이. 엄마, 아빠가 일 보러 나간 사이 집에 불이나 유독가스를 마시고
중태에 빠졌던 두 아이. 두 아이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2년 겨울, 서울 광화
문역 안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장엔 이 아이들을 기억하기 위한 분향
소가 차려졌습니다. 아이들 영정 옆엔 역시나 화재로 먼저 세상을 떠난 김주영 씨
의 영정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죽음 이후, 뉴스 사회면을 통해 장애인
화재 사고 소식을 몇 건 더 접했습니다. 이러한 죽음이 그간 없었던 것일까, 이제
야 뉴스 가치가 생기기 시작한 것일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가 누구
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드러나지 않는 채 ‘미처 불을 피하지 못해 사망한 어느
장애인’으로 기록되는 죽음이 쓸쓸할 따름입니다.
“집계될 수 없는 그들의 죽음은 소리 없는 눈처럼 내린다.”
2012년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를 준비한 한 활동가가 쪽방에서, 거리
에서 생을 마감한 홈리스분의 삶을 기록한 글을 봤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죽음은
눈처럼 소리 없이 내리기에 수시로 창을 열어 보아야 보인다고 했습니다. 올해 추
모제에도 새로운 액자들이 내걸렸습니다. 죽은 이의 얼굴이 담긴 사진 액자들. 하
나의 거대한 우주가 소리 없이 사라지고, 사진 한 장으로 남아 서울역을 바쁘게 지
나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일까? 이것이 현실인가? 꿈인가? 눈 뜨면 전달되는 죽음에 어안
이 벙벙합니다. 죽음에 사로잡힌 어느 겨울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노들바람 제95호 보기 ▶ 노들바람 95호.pdf
- 이야기 구성 -
02 노들바람을 여는 창
03 [장판 핫이슈] 살아 남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만나요
06 [뽀글뽀글 활보상담소] 어느 장애인 이용자의 토로
08 모두가 하늘이다!
12 씨앗성장기_흙의 이야기
13 [노들아 안녕] 박기남 신입학생
14 [노들아 안녕] 최재민 신임교사
16 [대학로야 놀자] 좋은 예, 나쁜 예
20 일본 하나아트센터와 에이블아트
28 [교단일기] 273버스 안에서
30 [현수막으로 바라보는 세상] 관심 가지기
연간기획 [우리, 집, 이야기]
34 내가 살고 싶은 집
40 우리가 그린 살고 싶은 집
43 극단판 아니, 센터판 출범!
45 순회공연을 하고 나서…
48 [나는 활동보조인입니다] 김남흥 님
50 혜화독립진료소 세 돌을 맞이하며
52 [형님 한 말씀] 겨울의 길목에서
53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54 [동네 한 바퀴] 다 같이 돌자~♬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56 [노들책꽂이] 『도토리의 집』
58 [오 그대는 아름다운 후원인] 이지연 님
61 [노들은 사랑을 싣고] 센터 전 활동가 박상호 님을 만나다
67 고마운 후원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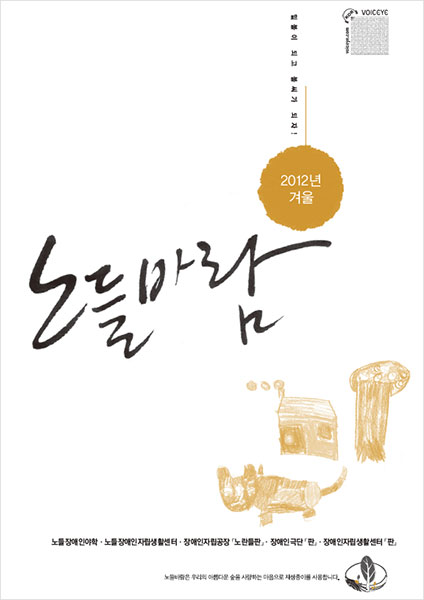
- [장판 핫이슈]살아 남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만나요,
- [뽀글뽀글 활보상담소]어느 장애인 이용자의 토로,
- 모두가 하늘이다!,
- 씨앗성장기_흙의 이야기,
- [노들아 안녕]박기남 신입학생,
- [노들아 안녕]최재민 신임교사,
- [대학로야 놀자] 좋은 예 나쁜 예,
- 일본 하나아트센터와 에이블아트,
- [교단일기]273버스 안에서,
- [현수막으로 바라보는 세상]관심 가지기,
- 연간기획[우리. 집. 이야기],
- 내가 살고 싶은 집,
- 우리가 그린 살고 싶은 집,
- 극단판 아니 센터판 출범!,
- 순회공연을 하고 나서…,
- [나는 활동보조인입니다]김남흥님,
- 혜화독립진료소 세 돌을 맞이하며,
- [형님 한 말씀]겨울의 길목에서,
-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 [동네 한 바퀴]다 같이 돌자~♬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노들책꽂이]『도토리의 집』,
- [오 그대는 아름다운 후원인]이지연님,
- [노들은 사랑을 싣고]센터 전 활동가 박상호 님을 만나다,
- 고마운 후원인들,
-
Read More

2014년 가을 노들바람 제102호
노들바람 이야기구성 1. 노들바람을 여는 창 2. 딸과 아빠의 공동투쟁 3. 광화문농성 2주년 투쟁보고서 4. 광화문 농성 2년을 맞아 최옥란 열사를 기억하며 5. 소통을 위한 수화반 6. 풍성한 배움 7. 나의 저상버스 첫 경험 8. [형님 한 말씀] 가을이 오는 길...Reply0 Views667
-
Read More

2014년 7월 노들바람 제101호
노들바람 이야기구성 노들바람의 ‘노들’은 노란들판의 준말입니다. 농부의 노동이 녹아난 들판에 넘실대는 결실 들을 뜻하는 말로 노들인 모두 대지를 일구는 농부라 생각합니다. 시퍼런 ‘경쟁’의 도구로 차별과 억압의 들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Reply0 Views708
-
Read More

2014년 1월 노들바람 제100호
노들장애인야학 스무해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합시다 이것은 노들야학 사람들이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그래서 실패한 적이 없는 기우제에 관한 이야기다. 노들야학의 배움, 투쟁, 그리고 삶 그 모든 것들을 하루하루 일구어 나가는 ...Reply0 Views444
-
Read More

2013년 12월 노들바람 제99호 겨울호
2013년 12월 노들바람 제99호, 겨울호 [노들바람을 여는창] 노들 20주년, 노들야학의 스무 번째 한 해. 조금은 특별한 이 한 해를 붙들고 무엇을 할 것인가 골몰하며 2013년을 보냈습니다. 2013년 초 아니 그 전부터 이미 예상했던 정신없고 바쁜 시간이었습니...Reply0 Views1863
-
Read More

2013년 10월 노들바람 제98호 가을호
2013년 10월 노들바람 제98호 가을호 [노들바람을 여는창] 노들은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준비로 요즘 무척 바쁩니다. 야학은 10월 중순에 1주 동안 열 릴 행사 준비로 수업은 잠시 접어두고 매일같이 연극, 노래, 춤 같은 걸 연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Reply0 Views1566
-
Read More

2013년 6월 노들바람 제97호 여름호
2013년 6월 노들바람 제97호 여름호 [노들바람을 여는창] 새벽 세 시, 대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 집 현관문을 향해 간다. 덜덜덜 드드드드드. 열린 창틈으로 냉장고 울음소리 가 들린다. ‘왜 이제 왔어? 응?’ 현관문을 여니 기타가 서 서 나를 지켜본다. ‘며칠...Reply0 Views1559
-
Read More

2013년 3월 노들바람 제96호 봄호
2013년 3월 노들바람 제96호 봄호 [노들바람을 여는창] “쓰러지고 깨지는 것들 속에 서있는 수밖에 없다. 어차피 괴롭고 슬픈 사람들, 쓰러지고 짓밟히는 것들의 동무일진대, 신경림 시인이 이르듯 이것이 그다지 억울할 것은 없다.” <부싯돌> 1호, ‘교사의 글...Reply0 Views1745
-
Read More

2012년 12월 노들바람 제95호 겨울호
2012년 12월 노들바람 제95호 겨울호 [노들바람을 여는창]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를 치렀습니다. ‘화’를 못 누르고 술을 한 사흘 정도 퍼 마셨습니다. 눈 뜨면 아침, 눈 뜨면 대낮, 세상은 그 대로 굴러가고 내 몸만 바뀌더군요....Reply0 Views1496
-
Read More

2012년 11월 노들바람 제94호 늦은 가을호
2012년 11월 노들바람 제94호 늦은 가을호 [노들바람을 여는창] 머릿속이 텅 비었다. 한동안 이 책을 빨리 만들어내야 한다는 생각 말고는 끈질 기게 이어지는 생각이라는 것이 없었다. 할 수 없었다. 사람이 죽었다. 얼마 전 농성장에서도 마주친 사람이 죽었...Reply0 Views1456
-
Read More

2012년 8월 노들바람 제93호 여름호
2012년 8월 노들바람 제93호 여름호 [노들바람을 여는창] ①... <노들바람>이 점점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계절에 한 번 낸다는 이유로 몸집을 불려가고 있습니다. 제법 계간지 같은 모습이 되어 가는데, 단체 소식지치곤 과한 모습이지요. 우리의 <노들바람>은 ...Reply0 Views15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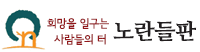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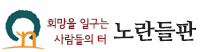
 2013년 3월 노들바람 제96호 봄호
2013년 3월 노들바람 제96호 봄호
 2012년 11월 노들바람 제94호 늦은 가을호
2012년 11월 노들바람 제94호 늦은 가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