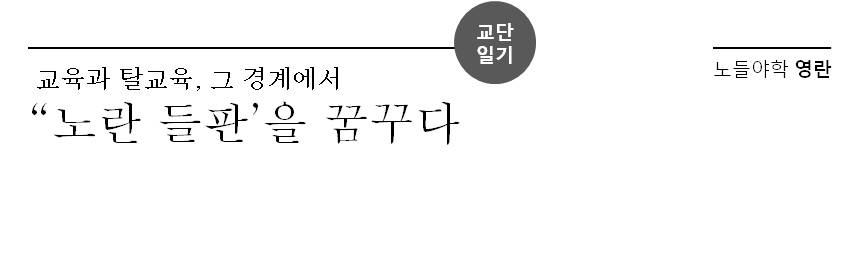

내가 처음 노들을 알게 된 건 EBS 지식채널을 보고 나서부터이다. 휠체어를 끌고 작업장에 가서 낮에는 일을 하시고, 밤에는 야학에서 공부를 하시던 한 남성분. 피디가 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냐고 물었을 때 그럼 피디님은 왜 사시냐고 답문하던 한 여성분. 그 분들을 영상에서 본 순간 온몸에 전율이 왔다.
그리고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야학에 가겠노라고.
그 다짐은 작년 1월에야 지킬 수 있었다. 나는 준호 선생님의 청솔 2반 수학 수업을 보조하며 야학수업에 어렴풋이 적응해 나갔다. 그리고 꼬박 1년 만에 노들 정교사 자격증을 쥐게 되었다. 수여 당시에 아마 허세 돋는 말도 한 것 같다. 이 땅에서 ‘노들’이 사라질 때까지, 모두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실현될 때까지 열심히 교육하겠다고.
그렇게 다부진 자세로 청솔 2반 생활수학을 담당하게 된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월요일 1교시에 학 생분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생활수학’이라는 수업 자체가 정해진 교재도, 교육과정도 없었기에 장단점이 뚜렷한 수업이었다. 잘하면 학생분들의 요구에 맞게 수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못하면이도저도 산만하게 흘러가는 수업이 될 터였다. 다행히 수업 첫날에 학생분들께서 각자 원하는 공부를말씀해 주셨고, 나는 다소 긴장된 상태에서 열심히 그분들의 말을 기록하였다.
기다리던 두 번째 수업시간이 왔다. 나는 비장의 무기라도 준비한 듯 학교 도서관에서 빌린 수학책과 핸드폰을 꺼냈다. 1차시 수업의 목표는 거리 어림하기 및 단위(km, m)익히기였다. 네이버 지도를 켜서 학생분들의 집과 야학 간의 거리를 재고, 서로의 거리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비교해 보았다. 처음에는 눈을 반짝이던 학생분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초점이 흐려지시더니, 끝날 때쯤 되니 몇 분은 고개를 숙인 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계셨다. ‘이건 아니야,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자책하며또 궁금하신 건 없냐고 여쭤보니, 새로 오신 차미 님이 시계의 시침, 분침을 읽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하셨다. 훗, 그거야 자신 있다며 다음 수업을 약속하고 야학을 빠져 나왔다.
대망의 세 번째 수업. 학교 자료실에서 내 몸통만 한 시계를 낑낑대며 들고 야학에 도착하였다. 학생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 뒤 수업을 시작하였다. 비장의 시계를 꺼낸 순간 내 예상과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졌다. 시계를 설명한 지 한 오분쯤 흘렀을까? 차미 님은 시계에 마음이 떠나신듯 시큰둥해 보이셨고, 나머지 학생분들은 이미 난 다 볼 줄 아는데 너무 쉽다는 반응이셨다. 이대로 수업을 진행할 수는 없었고, 학생분들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었다. 명색이 교사라는 사람이 학생의 기호조차 파악하지 못 하고 수업을 진행하나 싶어 마음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몇 차례의 시행착오 끝에 내린 결론은 ‘맞춤형 수준별 수업’이었다. 아무래도 연산능력을 키우면 수학수업 때 이해력이 높아지실 것 같아 시작하게 되었다. 다행히 학생분들도 열정적으로 참여하시고, 수업보조를 해주시는 분들도 꽤 계셨기에 별 탈 없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 같다.
초등학교 교사로 지내온 지 4년차. 나름 교육에 관심 많고 고민도 많이 해보았다고 자부하였지만,특수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노들에 뛰어드니 시작부터 녹록지 않았다. 하지만 그게 노들 안에 내가 있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불완전한 그 자체로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애정과 연대의 끈을 놓지 않는 노들이라는 공간. 월요일 근무가 끝나고 주린 배를 움켜쥐며 노들로 향할 때, 때로는 쉬고 싶을 때도 있지만(죄송합니다) 병기 님의 주름진 미소가 내 발목을 잡는다. 영애언니가 스승의 날에 수줍게 내미신 빨간 양말도 내 발에 곱게 신겨져 있다. 내가 볼펜을 훔쳐갔다며 도끼눈을 뜨고바라보시는 남옥언니도 눈앞에 아른거린다. 그들이 있기에 오늘도 게으른 나는 노들로 향한다.
가끔 지인들이 묻곤 한다. 노들야학은 어떤 곳이냐고. 나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이 물음에 다양한 답변을 한다. “응, 성인 장애인분들이 공부하는 곳이야.”, “장애인권 투쟁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많이 계신 곳이야.” 오늘날의 저상버스와 지하철 엘리베이터도 노들 투쟁의 산물이었다는 걸 얘기할 때면 은근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도 한다. 하지만 내가 가장 와 닿았던 답변은 이것이었다.
“응, 사람 냄새 나는 곳이야.”
야학의 밤이 저물고 나면 나는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의 품으로 간다. 그 아이들에게도 이 ‘냄새’를느끼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교육과 탈교육의 경계에 펼쳐진 노란 들판에 모든 이들이 함께 어우러져부대끼며 살고 싶다.
 2014여름 101호 - [노들아 안녕] 김선아
2014여름 101호 - [노들아 안녕] 김선아
 2014여름 101호 - [나쁜행복을 말하다] 진심이 아...
2014여름 101호 - [나쁜행복을 말하다] 진심이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