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
장애를 다시 정의하는
혁명을 시작하자
(콜린 반스 외 엮음, 『장애학의 오늘을 말하다』, 김도현 옮김, 그린비, 2017.)
박정수 | 2016년 3월에 『비마이너』 객원 기자로 일하러 왔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기사 쓰는 대신 꽃 가꾸고 농사짓고 있다. 현재는 노들장애인야학에서 철학 수업도 하고 노들장애학궁리소에서 공부도 하면서, 또 옥상에서 지을 농사를 준비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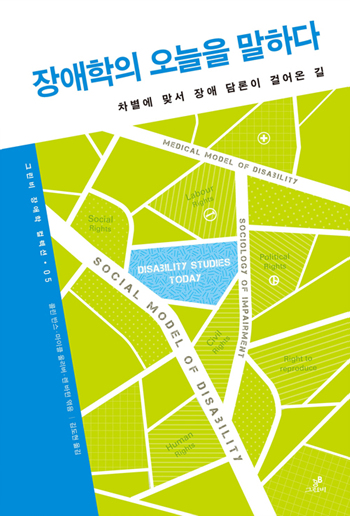
장애인운동조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올해 슬로건으로 ‘혁명의 시작’을 내걸었다. 대통령을 끌어내린 촛불시민혁명의 에너지로 사회를 바꾸는 혁명을 시작하자는 거다. 혁명? 그것도 장애인이? 그들은 사회학자 존 맥나이트(John McKnight)의 말을 빌려 혁명을 이렇게 정의한다. “문제로 정의된 사람들이 그 문제를 다시 정의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혁명은 시작된다.” 혁명이란 그저 한 사회의 우두머리를 바꾸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회의 문제설정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가령 우리 사회의 문제꺼리로 여겨진 장애인, 동성애자, 이주민들이 나서서, 오히려 문제는 자신들을 문제시하는 사회적 의식과 질서에 있음을 확인시키며, ‘정상’이란 무엇인지, ‘국경’이란 무엇인지, ‘성’(sexuality)이란 무엇인지 다시 정의하는 과정이 사회를 바 꾸는 혁명이다. 장애인운동조직이 ‘혁명의 시작’을 외치는 것은 생뚱맞은 게 아니다.
때마침 이런 의미의 혁명 담론으로서 장애학(disability studies) 에 관한 책이 번역 출간 되었다. 『장애학의 오늘을 말하다』는 콜린 반스(Colin Barnes), 마이클 올리버(Michael Oliver), 렌 바턴(Len Barton) 등 영국 장애학의 1세대 이론가 들이 편저한 책으로, 영국과 미국에서 장애학이 출현한 과정과 장애학 내부의 쟁점들을 다룬 13편의 글을 모아 놓았다. 이 책은 학문적 관점에서 장애학을 설명한 책이 아니라, 운동적 관점에서 장애학의 존재 이유와 문제의식을 알게 하는 책이다. 특히 영국의 장애학은 장애학이 장애인을 정의하고 분류하고 관리하기 위한 학문, 즉 국가학(통치학)이 아님을, 장애학은 문제로 정의된 장애인들이 스스로를 주체화하는 운동 속에서 장애는 개인적 결손이 아니라 사회적 차별과 장벽이라고 문제를 다시 정의하는 혁명 담론으로서 출현했음을 보여준다.
장애인 운동 속에서 장애학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영국에서 장애학은 60년대 말의 대항문화 속에서, 70년대 ‘분리에저항하는신체장애인연합’(UPIAS), ‘장애인해방네트워크’ 등 장애인운동조직의 전투적인 활동 속에서 출현했다. 장애학 과정은 처음부터 대학 내 분과학문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1975년 오픈 유니버시티의 학제 간 연구팀에 의해 만들어졌다.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장애인 임상심리학자 빅터 핀켈스타인(Victor Finkelstein)이다. 그는 아파르트헤이트 철폐 운동가이자 장애인운동가였으며, UPIAS의 창립 멤버이기도 했다. 오픈유니버시티는 이름 그대로 18세 이상, 영국 거주자,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의 학문 분과에 얽매이지 않은 학제 간 연구와 새로운 교수법으로 기성 교육에서 배제된 이들의 접근권을 보장했다. 오픈 유니버시티의 장애학 과정은 개설 첫해 1,200명 이상의 학생을 모았다. 여기에는 전국에서 온 관련 전문가, 자원활동가,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장애학 과정은 1994년에 폐지되기 전까지 두 차례 갱신되었으며, 거기서 생산된 풍부한 자료는 영국 전역 주류 대학들의 학부 및 대학원에서 장애학 과정과 전문가 양성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이렇게 출현한 영국의 장애학은 산업혁명 이래 장애를 규정해 온 의존, 자선, 의료, 우생담론에 도전하여 장애를 양산하는 사회적 환경들에 대한 유물론적 연구를 조직했다. 의료적 장애모델에 대항한 그들의 ‘사회적 장애모델’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철폐하고, 장애인의 사회적 시민권을 쟁취하는 투쟁의 근거를 제공했다.
하지만 다분히 맑스주의적·유물론적 사회학에 입각한 영국의 장애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도전에 부딪혔다. 한편으로 사회적 장애모델은 동시대에 출현한 ‘몸의 사회학’, ‘푸코의 권력 이론’, ‘페미니즘’ 등 전통 맑스주의와는 다른 방식으로 장애를 둘러싼 담론과 권력을 분석하는 이론적 실천에 도전받았다. 다른 한편으로, 대학 제도 안에 편입되면서 장애학은 체제 내화할 위험에 직면했다. 대학은 장애인운동조직보다 국가 행정조직과 더 많은 친연성을 갖고 있다. 국가학으로서의 ‘객관성’, ‘책임성’을 요청받으면서 장애학은 혁명적 담론의 전투성과 실제성을 상실할 위기에 직면했다.
『장애학의 오늘을 말하다』는 장애인운동과 장애학의 관계에 대해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장애인운동조직에 종속되지도 않으면서, 통계학(statistic, 즉 국가학)에 흡수되지도 않는, 소수적이고 혁명적인 장애학의 실천 전략은 무엇인가? 장애학 연구조직은 정부, 대학, 장애인운동조직과 어떤 거리를 두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국가학으로부터 탈주하는 장애학은 어떤 새로운 연구 방법론과 연구 윤리를 발명하고 실천해야 하는가? 이 책을 번역한 김도현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활동가이자 노들장애인야학 교사로, 최근 ‘노들장애학궁리소’라는 장애학 연구조직을 만들었다. 대학 내 장애학 과정이 아직 하나도 없고, 2015년에 만들어진 ‘장애학회’가 하나 있지만 별다른 담론을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장애인운동조직과 연결된 ‘노들장애학궁리소’가 앞으로 어떤 혁명적 담론을 생산할지 기대 되며, 이 책은 많은 참조가 될 것이다.
소수자 운동 속에서 장애학은
무엇과 이웃하고 있는가?
미국의 장애학은 정체성의 정치와 관련하여 장애학의 횡단성을 사 유하게 한다. 미국의 장애인운동은 장애인에 대한 동정과 보호의 관점인 ‘퍼터널리즘’(paternalism)과의 싸움으로, 탈시설, 자립생활, 활동보조를 위한 시위, 버스 운행 저지, 시민불복종, 법률 제정, 소송으로 점철된 역사를 갖고 있다. 그 결과 1977년 ‘장애인에 관한 백악관 컨퍼런스’가 열려 3,000명 이상의 학계 및 장애계 대표자들이 모였으며, 그해 처음으로 장애학 과정이 대학에 개설되었다. 미국의 장애학은 장애 정체성 형성에 대한 문화사회학적 연구가 많다. 장애인이 개인적·집단적 차원에서 자신의 장애를 인식하는 방식은 무엇이며, 사회적으로 장애가 인식되는 문화적·상징적 방식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미국 장애학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 장애인운동의 압도적 다수가 교육 받은 중산층 출신의 가시적 장애를 가진 백인 남성이라는 점이다. 가령 서부 외곽의 빈민가에 거주하는 장애를 가진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은 확고한 장애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장애 정체성 외에 인종적, 계층적, 젠더적 정체성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장애인은 장애인이기만 한 게 아니다. 그녀 혹은 그는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다. 그녀 혹은 그는 흑인이거나 히스패닉일 수 있고, 게이이거나 레즈비언일 수도 있다. 좀 더 일반적으로 그는 여성이고, 노인일 수 있다. 소수민족 장애여성의 체험에서 젠더, 인종, 장애라는 각각의 사회적 분할은 서로 어떻게 결합되고 상호작용할까? 흑인 장애여성이 승진에 탈락했을 때 그것은 장애 때문일까? 여성이어서일까? 때로는 장애인 차별이 여성 차별을 은 폐하는 빌미가 되기도 한다. 남자 장애인의 성욕과 여성 장애인의 섹슈얼리티는 어떻게 다른가? 장애인의 성과 무성애자의(asexual) 성은 어떻게 다른가? 장애 정체성을 절대화하지 않고 자기 안의, 혹은 타인들의 다른 정체성들과 장애 정체성이 혼합되고, 연결되고, 치환되고, 상충하는 이유와 방식을 면밀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장애인 차별철폐 운동은 그동안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2012년 8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무기한 농성 이후 빈민 운동, 비정규직 노동자 운동, 철거민 운동, 성소수자 운동, 페미니즘 운동과 물리적으로 연대하는 경험을 쌓아 왔다. 이런 운동의 연대는 장애학(disability studies)과 여성학(women’s studies), 게이·레즈비언학(gay and lesbian studies), 흑인학(black studies), 소수민족학(ethnic studies)과의 연관을 사유하게 한다.
장애학은 장애인이라는 특이한 집단에 대한 특수 학문이 아니다. 장애학은 장애와 비장애의 분할선이 여성과 남성의 분할선, 정상적인 성과 비정상적인 성의 분할선, 우월한 인종과 열등한 인종 사이의 분할선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각각의 분할선들이 그어지는 이유와 방식들 간에는 많은 공통점과 연관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한다. 또한 장애인은 우생학적 추방의 경험 속에서 동물적 삶과 가까운 경험을 갖고 있으며, 생체공학(bionics)의 발전 속에서 사이보그(유기체+기계체)와 친근한 존재론적 경험을 갖고 있다. 장애인의 삶을 이해하려면 인간의 척도, 인간의 고유한 본질에 대한 고집을 버려야 한다. 장애학은 정상과 비정상, 나아가 인간과 비인간의 분할선에 대해 탐구한다. 19세기의 인간학(human science)이 인간의 본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면, 21세기의 인간의 척도를 해체하는 새로운 인간학이라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통치 하에서
장애학은 무엇을 연구해야 하나
이 책은 20 02년에 영국과 미국에서 처음 발간되었다. 그러나 이 책이 다루는 이슈들은 이미 지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심화될 문제들이다. 특히 이 책은 ‘지구화’란 이름으로 진행된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장애인이 처한 삶의 위기를 진단한다. 신자유주의적 통치 하에서 복지 영역과 노동 영역이 동시에 축소되면서, 노동하지 못하는 자들, 복지수당을 받는 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혐오가 심화되고 있다. 탈-노동사회가 도래하고 노동가치론의 위기가 임계점에 도달함에 따라 비노동적 삶을 가치화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장애인의 삶을 가치화하는 것은 이제 장애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탈-노동사회를 위한 일반 사회학의 이슈가 되고 있다.
이 책은 또한 신자유주의 속에서 장애인 ‘케어 홈’의 상품화가 확산되어 돌봄이 시장의 논리에 종속될 위험을 경고한다. 바우처 제도를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한국의 복지정책 하에서 돌봄의 영역과 시장의 영역, 공동체의 인간관계와 시장의 인간관계 각각의 특성과 상호작용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개인의 선택과 책임에 집중된 신자유주의 윤리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가를 매개로 한 인간관계와 시장(화폐)을 통한 인간관계, 일상의 공동체적 인간관계 각각의 특성은 무엇이고, 돌봄(복지)의 인간관계는 어떤 원리로 가져가야 좋을지 다각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오늘날 장애학에 주어진 과제다. 『장애학의 오늘을 말하다』를 번역한 김도현 씨의 ‘노들장애학궁리소’가 앞으로 할 일이 참 많다.
* 이 글은 비마이너에도 실렸습니다.
 2017년 봄 110호 - 민들레 10년을 말하다
2017년 봄 110호 - 민들레 10년을 말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