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어떻게 공모자가 되었나?
『 살아남은 아이 』 한종선·전규찬·박래군 지음, 문주 출판, 2013
노들센터 지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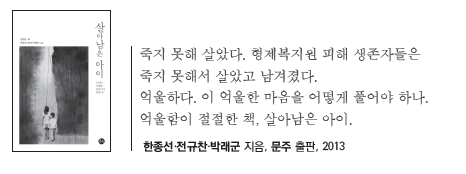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갑자기 나를불러내더니 왜 그랬냐고 소리소리를 질렀다. 무슨일인지, 왜 혼나야 하는 건지 물어볼 엄두가 안나서 그대로 서 있었다. 그러다 선생님은 나를 밀어버렸고 나는 그대로 뒤로 넘어졌다. 참 억울했다. 아직도 또렷이 기억이 난다. 담임선생님의 그 찐한 눈썹 꼬리가. 그 날은 하루 종일 멍했고 자신이 없었고 불안했다. 몸을 어떻게 가누어야 하는지, 뭘해야 하는지, 화장실을 가야 하는지, 친구들은 날 어떻게 봤을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영문을 모른 채 당한 하루의 폭력이 이후 며칠 동안 나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떠올리니 새삼 억울해진다. 이렇게 폭력의 기억은 20년이 되도록 닳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다. 만약 그 담임선생님이 나중에라도 나에게 미안하다고 했다면 어땠을까? 생각건대, 적어도 억울하진 않았을 것이다.
책 살아남은 아이는 부산의 형제복지원이라는 수용시설의 민낯을 낱낱이 고한 책이다. 형제복지원에서 살아남은 피해자 한종선 씨의 아주 얕은 기억부터 그곳에서 누나, 아버지까지 만난 절망의 기억까지. 이렇게 책을 읽는 것이 고역일 수 있을까... 책을 그냥 덮어버리고 외면하고 싶었다. 세상 참 고약스럽다 싶었다.
형제복지원에 수용되어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에 “잡혀”들어갔다. 길을 잃은 아이가 파출소에 맡겨져서, 동네에서 놀던 꼬마가, 막차를 놓쳐 부산역에서 하룻밤을 지내다가, 술에 취해 거리를 헤매다가, 그리고 또 누군가는 형제복지원의 자자한 소문을 듣고 제 발로 걸어들어가기도 했다. 집주소를 기억하고, 엄마 아빠 이름을 기억하고, 본인의 이름을 외울 수 있어도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의 기록표에는 고아, 주소 미상, 가명이 적혀질 뿐이었다. 이중, 삼중으로 된 철문이 열리고 그들은 막무가내로 쏟아져 내리는 몰매를 매일같이 맞았다. 집에 가고 싶다고 울어서, 밥을 흘리고 먹어서, 썩은 김치를 남겨서, 줄을 똑바로 맞춰 서지 못해서, 성폭행으로부터 저항해서, 주기도문을 외우지 못해서, 기합을 너무 잘 받아서. 그들 존재 자체가 맞을 이유가 되었고, 그게 그들의 유일한 일과였다.
국가가 만든 지옥 속에서 여전히 산다
한종선 씨는 자신의 어린 시절이 형제복지원에 멈춰있다는 것을 괴로워한다. 다른 이들처럼 어렸을 적 추억을 떠올리고 싶은데, 형제복지원에서의 지옥 같은 악몽이 훨씬 진하기 때문이다. 어린 한종선 씨는 누나와 함께 아버지의 바람으로 형제복지원에 맡겨졌다. 곧 데리러 온다는 아버지 말만을 믿으며, 형제복지원 지옥에 살았다. 그러던 누나는 형제복지원의 폭력으로 정신장애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를 만난다. 아버지가 왔다는 말을 듣고 이제 됐구나! 기뻐할 틈도 없이 뒤이어 들려온 “잡혀왔다”는 말을 듣고 표현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진다. 아버지를 원망했다. 그 절망의 나락을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한종선 씨 세 명의 가족은 형제복지원이 폐쇄되는 1987년이 되어서야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또 다시 뿔뿔이 흩어졌다.
형제복지원은 지옥이었다. 그럼 이 지옥은 누가 왜 만들었을까. 책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형제복지원은 1980년대 전두환 대통령이 깨끗한 거리 만들기 작업으로 시작되었다. 깨끗한 거리. 구걸을 하거나, 술에 취해 있거나, 부모 없이 혼자 돌아 다니는 아이들이나,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 이를테면 형제복지원에 잡혀 들어간 사람들은 치워져야 할 쓰레기였던 것이다. 두당 얼마. 형제복지원 원장은 쓰레기 처리 값을 톡톡히 받았고, 여전히 사회복지사업을 하며 살고 있다.
형제복지원은 국가가 만든 지옥이다. 경찰이 있었고, 부산시가 관리감독했고, 복지부에서 지원 받았다.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상황을 알고 원장을 법적으로 처벌하려한 검사도 있었지만, 법원은 원장의 죄를 제대로 묻지 않았다. 형제복지원은 그렇게 국가가 허락한 지옥이었던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한종선 씨에게 위험한 사람들은 격리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묻는다. 종선 씨는 대답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길에 쓰러져 있는데 도와 달라고 손을 내민다면, 그때는 도와주어야겠죠? 그런데 현실은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지원 사건이 그랬고, 도가니도,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아무리 도와 달라고 소리쳐도,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말하고 있다.
<살아남은 아이, 우리는 어떻게 공모자가 되었나.>
 2014 겨울 103호-내가 만난 진심들
2014 겨울 103호-내가 만난 진심들
 2014겨울 103호 겨울 - 오 그대는 아름다운 후원인
2014겨울 103호 겨울 - 오 그대는 아름다운 후원인













